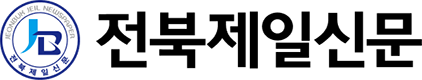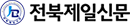전북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지역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은행 건전성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불리는 연체율 1.0%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수치 악화를 넘어, 지역 자금줄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도내 금융권 및 JB금융지주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전북은행의 총 연체율은 1.27%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0.78%) 대비 0.49%포인트 급등한 수치로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 중 유일하게 1%대를 넘겼다.
통상 금융권에서의 연체율 1%는 부실 위험의 임계치로 불린다.
특히, 부실채권(NPL)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0.93%까지 치솟으며 1%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는 전북은행이 보유한 대출 중 '못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이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거다.
전북은행의 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은 전북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고 있는데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건설 경기 부진이 지역 내 하청 업체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연쇄적인 타격을 입혔고, 이것이 고스란히 은행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 군산·익산·정읍 등 제조업 기반 지역에서는 “전북은행의 심사 강화 이후 사실상 신규 자금 조달이 막혔다”며 “흑자 기업도 이자 상환 압박만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북은행은 '디마케팅(Demarketing·고객 수요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전략)' 등을 통해 보수적인 여신 관리에 돌입했다.
연체 채권을 상각·매각해 장부상 수치를 관리하고, 신규 대출 심사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은행의 이러한 방어적 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돈맥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대출 규제하면 유동성이 절실한 건실한 중소기업마저 흑자 도산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전형적인 '비 올 때 우산 뺏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 중견기업인 A업체 대표는 “전북은행의 연체율 급등은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 경기 침체의 결과다. 그런데 정작 은행은 책임을 회피하며 지원을 줄이고 있다”며 “지방은행이라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전북은행은 오히려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금융권 관계자도 “전북은 수도권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리고 지역은행 의존도가 높다”며 “이 시기에 대출을 줄이면, 지역경제는 급격한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북은행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김종일 기자